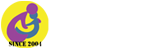작은 손이 우리들 큰손을 잡고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 작성자: 서영은
- 작성일: 12-05-22 11:52
- 조회: 1,760회
관련링크
본문
하지만 얼마전...1년 동안 병원에 입원중인 아줌마를 또다시 찾았을 땐 완전히 할머니가 되 있었습니다.
하긴 벌써 67세이니 이젠 아줌마라고 부르긴 많이 어색한…….할머니가 더 어울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할머님은 보통사람들보다 많이 왜소한 체구에 아무도 없이 이제껏 홀로 지냈었습니다.
퇴원한다 해도 아무도 없는 할머니는 병원 밖으로 나와..... 또다시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가진 게 있어도, 아니 연고가 있다고 하면 이대로 병원에 두질 않을…….열악한 환경의 노인요양병원은 마치 폐업중인 병원처럼 어둡고 칙칙해 위생에 둔감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페인트공사로 병원은 이미 제구실을 포기한 듯 해 보였습니다.
먼지와 냄새…….그 속에서 할머님은 가장 어두운…….햇볕도 들지 않는 구석자리 침대에 몸을 맡기고 계셨습니다.
어버이날에(행사가 많아서 우리들은 오지 못했는데…….) 누가 다녀갔는지 형체만 간신이 남아있는 카네이션 바구니가 할머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머리를 곱게 길러 올리고 다니 셨었는데 희어진(그동안 염색을 하였었는지 이렇게 흰머리는 처음 보았다)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버리셨습니다.
간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매주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팔 힘을 기르고자 묶었다고 하는 실타래를 꼭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할머님은 창백해 보이는 흰 얼굴에 몸도 더 작아져 마치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거인처럼 큰 우리들이 너무 다른 서로를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가지고 간 두유를 드리니 한 개 드시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인지 파르르 떨리는 작은 손이 우리들 큰손을 잡고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늘 그리울 할머님~ 그 마음 우리가 잘 이해되지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노인들을 만나고 오는 날엔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들의 앞날과,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다 그럴 텐데 하는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한번쯤 생각게 합니다.
병원 밖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날이었는데 마치 어느 굴속에서 나온 듯 밖과 안은 너무 달랐습니다.
박길자 할머님!
하루 빨리 쾌차하셔서 병원 밖으로 나오시길 기원할게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